No. 26 | 일기
No. 25 | 백업
◆ COMMENT ◆
No. 24 | 일기

◆ COMMENT ◆
No. 23 | 일기


◆ COMMENT ◆
No. 22 | 일기

◆ COMMENT ◆
No. 21 | 일기
◆ COMMENT ◆
No. 20 | 일기

◆ COMMENT ◆
No. 19 | 일기

◆ COMMENT ◆
No. 18 | 일기

◆ COMMENT ◆
No. 17 | 일기


◆ COMMENT ◆
No. 16 | 일기

◆ COMMENT ◆
No. 15 | 일기
해야 할 일 정리
◆ COMMENT ◆
No. 14 | 일기

No. 13 | 일기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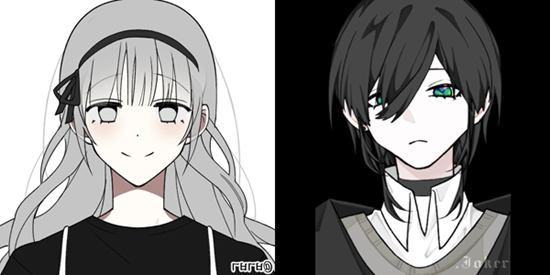
◆ COMMENT ◆
No. 12 | 일기


◆ COMMENT ◆

해야 할 일 정리
~ 7/1 주희 커미션 마감
이번 달 안으로 친구들한테 편지 쓰기
올해 안으로 단편 하나 쓰기 (이건 희망사항)
급한 건 대략 이 정도
까먹지 말 것
◆ COMMENT ◆